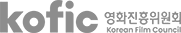상영작 리뷰
시민평론단 - 비전
<겨울날들> : 겨울의 시린 한기
최승우 감독의 두 번째 영화 <겨울날들>은 제목이 곧 내용이다. 뼈를 강타하는 추운 겨울바람처럼 말조차 꺼낼 수 없는 한기만 맴돈다. 이 영화는 명확한 사건도 생기지 않고 인물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감독의 “말하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다면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선언에 걸맞는 연출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언어가 유실된 자리에는 황량한 인물의 이미지만 남아있다.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철거 공사하는 남자, 차갑고 분리된 이들을 바라보지만 왜인지 긴밀하게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과 우리가 끈끈히 이어져 있음을 안다.
<겨울날들>은 거창한 서사나 사건을 다루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을 조용히 관찰한다. 그들은 먹고, 씻고, 정리하고, 이동할 뿐이다. 극도로 일상적인 행동들. 잊히고 무감각해지는 일상의 이미지들이 카메라에 각인되고 감각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일상적 순간을 감각하기 시작한다. 오프닝과 중간중간 삽입되는 철거 현장의 모습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파괴는 창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첫 단계이다. 낡아 부서져 가는 건물의 모습은 겨울바람에 시들어가는 인물들의 내면을 시각화한다. 인물들의 마음속에서는 붕괴하는 파열음만 울릴 뿐,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삶의 고요를 파괴하고 재건할 미래를 은유하는 이 소리는 멈춰 있는 듯 조금씩 진행되는 일상에 숨겨진 리듬을 드러낸다. 먹고, 자고, 씻고, 걷는 이토록 평범한 행위들을 반복함으로써 더 이상 일상이 아닌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다.
인물들은 서로를 만나지도 않고 아마 일면식도 없는 사이일 것이다. 그렇지만 추운 겨울날을 이겨내는 모습에서 무언의 연대가 보인다. 차가운 바람, 무채색의 도시 풍경과 흐려진 소통, 세 가지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인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인물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공허한 여백에는 고독과 침묵이 전체를 채운다. 이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일까? 소통의 부재는 현대인의 모습을 꿰뚫는다. 자살에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는 뉴스 음성에 인물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다. 그저 버텨내기 위한 먹는 행위를 지속할 뿐이다. 누군가 투신을 할 때도, 인물의 놀라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반응을 보여 주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의 부재이며, 나아가 현실 감각의 상실을 보여 준다. 비극적인 사건들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처럼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겨울날들>은 인물의 무덤덤한 행위를 통해 현대 사회의 충격과 고통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충격과 고통은 비극적인 사건이나 인물의 감정 변화로 보여 주지 않는다. 대신 <겨울날들>은 묵묵히 겨울을 견뎌내는 인물의 무덤덤한 일상 그 자체를 통해 표현한다. 특별할 것 없는 겨울날들을 그저 벼텨내는 행위가 곧 현대 사회의 고통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