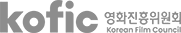상영작 리뷰
시민평론단
<마른 잎> : 흐릿한 경계
<마른 잎>(알렉산드레 코베리제, 2025)은 길에서 시작하고 길 위를 반복하며 나아가며 지나온 길을 떠올리는 회상 속에서 끝맺는다. 이야기의 시작과 함께 인물들은 길을 나서지만, 그들의 행로는 그들이 바라보는 풍경처럼 희미하기만 하다. 영화의 이야기 역시 길을 떠나는 인물들과 함께 시작하지만, 한곳으로 나아가던 이야기는 자주 풍경 속으로 시선을 틀며 가야 할 곳을 잃은 듯 번져 나간다. <마른 잎>은 희미하게 번져 나가는 세계를 보이지만 그곳에서 길을 잃지 않고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는 희미하게 번져 나가는 <마른 잎>의 풍경과 이야기 속에 딸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일관된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며, 그래서 <마른 잎>의 세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인물들의 갈 데 없는 시선과 정처 없는 발걸음을 뒤따를 수 있는 듯하다.
<마른 잎>은 희미하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장면이 모두 아웃 포커싱되어 희미하게 보인다. 희미한 화면 처리는 <마른 잎>의 세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마른 잎>은 희미한 화면을 통해 영화 속 세상의 경계와 형태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아웃 포커싱되어 희미하고 모호하게 보이는 <마른 잎>의 화면에서 이 영화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마른 잎>의 세계에는 활기가 넘치지만 누군가의 빈자리가 있는 도시가 있고, 느리지만 고유한 리듬을 지닌 시골이 있다. 그리고 도시와 시골의 공간 안에는 사람과 동물이 있다. 사람은 영화의 프레임 안에서 형태를 지닌 인물과 형태 없이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물이 있다. 보이는 인물과 보이지 않는 인물이 함께 길 위를 나아가고, 이들이 접하는 사건 역시 새로운 사실과 이미 지나간 옛일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흐릿한 화면 안에서 경계가 흐트러진 채로 서로 어우러지고 있다.
<마른 잎>은 집을 떠난 딸 리자(이리나 첼리제)를 찾아 나선 아버지 이라클리(데이비드 코베리제)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결국 커다란 원을 이루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아낸다. 그 과정을 담아내는 화면은 마치 인상주의 회화처럼 펼쳐져 있고, 반복되는 풍경은 이 영화의 내적 리듬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마른 잎>은 화면에 펼쳐진 장면만으로도 충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영화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들만으로 <마른 잎>이 보이는 아름다움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듯하다. <마른 잎>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람과 동물, 도시와 시골이 화면 속에서 경계를 흐트러뜨린 채로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 속 모든 존재의 시선이 합쳐진 장면이 <마른 잎>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화면으로 나타나는 듯하다. <마른 잎>의 아름다움을 화면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화면을 바라보는 감각과 화면의 특성이 나타내는 어우러짐의 특성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