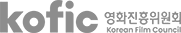상영작 리뷰
시민평론단
<마지막 푸른빛> : 골든 피시에는 그녀의 은하수가 살고 있을까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횔덜린이 말했다지.
‘지구상에 지옥이 만들어졌던 것은 항상 인간이 자신들의 천국을 만들려고 할 때였다.’
노인 세대 부양은 반드시 국가의 의무? 그것은 인류가 평생 맞닥뜨릴, 혹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요, 임무다. 그 의무이자 임무를 과감하게 실행한 세상이 있다. 영화 <마지막 푸른빛> 속 세상이다. 브라질 출신 감독 가브리엘 마스카루의 신작으로 2025 베를린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작이다. 가브리엘 마스카루가 찍어낸 4:3 비율의 세상은 유토피아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인가.
영화의 시작은 소리로 시작된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십니까. 브라질 국민 여러분. 노인 세대 부양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렇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 경로에는 늙고 병든 시기가 숨겨져 덮여있다. 그러니 반드시 누군가는 그 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행복한 삶. 우리는 복지국가를 늘 꿈꾼다. 영화 <마지막 푸른빛> 속 브라질 역시 복지국가를 꿈꾼다. 노인 세대에 대한 보호 약속은 곧 모두를 위한 미래다. 영화 속 브라질 정부의 미래는 밖에 돌아다니는 노인을 보이지 않는 장소인 ‘은퇴 구역’으로 슬쩍 가두는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보호’라는 언어유희로. 도시로부터 노인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 대책이자, 모두를 위한 미래였다. ‘노인 세대 부양’은 곧 노인을 안 보이게 혹은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이다. 그 마법에는 가족, 이웃이 밀고자가 되어 죄를 나눠 갖는다. 영화 속 정부는 결국 ‘은퇴 구역’으로의 이송을 가족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올가미를 가족에게 넘긴다.
주인공 데레사는 77세로, 비행기를 타보지 못하고 일만 하며 살아온 성실한 국민이다. 그녀는 악어 공장에서 악어를 손질하며 살아온 여성이자, 어머니였다. 영화 <마지막 푸른빛> 속 브라질 정부는 노인 데레사를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세월을 메달로 보상하고 그녀의 집을 커다란 월계수 장식으로 꾸며준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로부터 받은 헌사는 데레사에게 절대 달갑지 않은 보상이다. 오히려 월계수 장식은 표식이 되어 노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데레사를 감시하는 체계로 둔갑한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말하는 노인 부양이란 것은 결국 데레사의 딸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끊임없이 사고 치는 데레사를 관리하는 건 결국 딸의 몫이다. 정부가 겨우 하는 일은 데레사의 딸에게 데레사를 관리하게 만들고, 데레사를 보이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일일 뿐이다.
이제 데레사는 곧 정부가 지정한 곳으로 들어가서 철저히 눈에 보이는 브라질로부터 가려지고 사라져야 한다. 살아있는 국가 유산이라는 노인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요, 세상의 찌꺼기이다. 그들은 숱한 세월 속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국가를 지탱시켰지만, 남은 건 허물어진 육신뿐이다. 이제 노인은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어 폐기처분 대상이 된다. 진정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을까. 찌꺼기=잉여. 찌꺼기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인가. 그것이 잉여로의 전환을 꿈꿀 수는 없는가.
77세의 데레사는 생각해 보니, 자신이 그 흔한 비행기조차도 타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행사로 간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데레사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다. 그 흔한 비행기에 발을 닿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 데레사가 겨우 획득한 건 단 하나, 기저귀다. 정부는 데레사에게 수갑 대신 기저귀를 채운다. 기저귀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지만, 기저귀는 데레사를 국가 생산성 방해자로서 노인 격리 사업 2단계에 넣기 위해선 적절한 도구가 된다. 힘이 없는 노인에게 수갑은 인권 유린으로 보이겠지만, 기저귀는 노인을 위한 복지 물품으로 상향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겉옷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기저귀는 요긴하고 쓸모있는 물건이지만, 필요 없는 사람에게 기저귀란 선물은 무가치다. 데레사라는 하나의 인격을, 기저귀 하나만으로도 인체 기능 상실자로 만들어 버린다. 정부가 보는 77세의 데레사는 필요 없고 무가치한, 그저 기저귀를 찬 노인일 뿐이다. 아니 기저귀를 찬 노인으로 바꿔 버린다.
데레사는 어디로든 갈 수 없다. 그녀가 발을 디디고 다니는 땅에선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데레사는 끊임없이 탈출하고 되돌아온다. 데레사는 그래서 땅을 선택하지 않는다. 데레사는 굳은 땅 대신, 흘러가는 물을 선택한다. 데레사가 만졌던 첫 번째 집 안 속 달팽이는 현실이었지만, 데레사가 두 번째 만진 바닷속 달팽이는 탈출구가 된다. 푸른 빛을 쏘는 두 번째 달팽이를 눈에 갖다 댄 순간, 이미 데레사는 기저귀를 찬 영면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셈이다. 집 밖으로 던져진 달팽이가 바다에서 푸른빛을 몰고 와 마법같이 나타나서 영생한 것처럼. 데레사가 쫓겨난 악어 공장의 껍질 벗겨진 악어가 바다에서 수영하며 생명을 얻은 것처럼. 데레사도 누군가의 모자를 쓰고 새로운 페르소나를 갖고 배의 운전대를 잡는다.
결국 영화 <마지막 푸른빛>의 브라질 정부는 노인인 데레사를 지키지 못했다. 데레사가 만났던 젊은이들도 마약과 도박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지켜내지 못했다. 심지어 데레사를 그토록 절망시켰던 은퇴 구역은 돈으로 허가증을 구입해서 탈출이 가능했다. 종교를 부정하고 신神이 없다고 생각하는 수녀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가. 성서는 반드시 종이로 만든 것이 성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가. 화폐로 인정된 욕망은 욕망이 아닌가. 마침내 이 영화가 그려낸 이미지 혹은 내러티브가 허구인가? 혹은 재현인가.
영화 <마지막 푸른빛>의 4:3 화면 비율은 신기하게도 영화의 첫 시작부터 눈길을 끈다. 이 영화를 16:9 화면 비율로 찍었다면, 분명 호사스럽게 볼 수도 있다. 물을 따라가는 모습이 유려해 보일 수도 있었다. 16:9가 전해주는 프레임은 여유로움이 있다. 내화면과 외화면의 경계를 느낄 필요 없이 안정적인 구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달랐다. 철저히 타이트한 4:3을 선택한 건 신의 한 수였다. 데레사의 억압된 답답함이 그 화면 비율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때론 로드무비인가. 때론 델마와 루이스인가. 설마 델마처럼 절벽으로 배를 몰아버리나. 때론 현실과 몽롱한 상상이 결합한 초현실적 다다이즘인가. ‘악마의 피’를 이긴 ‘은하수’를 고른 데레사의 환상 혹은 환영이 헷갈릴 때, ‘델마’ 데레사는 뭍으로 다시 향한다. 그리고 ‘루이스’ 수녀를 데려온다. 델마가 루이스가 되고 루이스가 델마가 된들, 무엇이 진짜든 상관없다. 푸른빛을 쏘아대는 달팽이가 마법이었는데, ‘은하수’를 골라서 정말로 잭팟을 터뜨린다고 한들 무엇이 상관이랴. 우리는 지금 데레사가 모는 배에 타고 그녀의 바다를 보고 있는데. 재 아무리 비행기가 날아와서 ‘안녕하십니까. 브라질 국민 여러분. 노인 세대 부양은 국가의 의무입니다.’라고 한들.
데레사는 서 있다. 어느 물살 위 그저 앞만을 응시한 채. 기저귀를 벗어던진 데레사는 77세다. 데레사는 행위한다. 고로 데레사는 살아있다.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