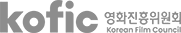상영작 리뷰
시민평론단 - 비전
<장손> :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두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부모님과 맞벌이로 인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성진은 공장을 이어 받으라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다. 연기를 하겠다며 호기롭게 서울로 올라갔지만 소득이 좋지 않아 결국 성진은 스스로 영화를 찍어 출연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어떻게 보면 철없게 보일 수도 있는 장손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을 맞이하면서 성진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내면적인 성장을 맞게 된다.
가족.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성진의 가족은 언뜻 보면 가부장적일 수도 있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간의 애증 속에서 피어난 애틋함이 돋보이는 이면적인 모습을 지닌 가족이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 제사에 올릴 전을 부치는 여성들과 방 안에서 화투를 치는 남성들은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여름날의 풍경이다. 더우니 에어컨을 좀 키자며 성을 내는 손녀의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할머니는 장손 성진의 등장으로 얼른 에어컨을 키자고 노래를 부르며 서두른다. 성진만을 애지중지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성진의 누나는 오히려 익숙하다는 듯 에어컨을 키며 시원하니 살 것 같다고 기뻐한다. 극 중에서는 인상이 찌푸려질 수도 있는 가족 내의 빈부격차나 성차별이 눈에 띄게 등장하지만 크게 거슬리는 점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어느 집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기 때문은 아니다. 영화는 이 가족의 가부장적인 면을 부각하는 것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유로 생겨났던 서로 간의 오해와 애증을 중심으로 서사를 풀어나가고 있다.
영화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의 애정을 드러내는 대목이 종종 등장한다. 더울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놓아주는 선풍기와 식탁 위의 밥그릇, 부서지지 않은 두부가 그런 역할을 한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짙으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 화면을 통해 드러난다. 화면 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액션과 가려진 공간을 활용한 장면들은 다소 불편하고 어두운 내용의 실상을 흔들리는 조명과 어둠을 통해 위태로운 가족의 갈등 분위기를 한층 더 자아낸다.
영화 <장손>은 계절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풍경과 함께 중심 사건을 다루고 있다. 더운 여름으로 시작했던 이야기는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과 함께 쓸쓸한 가을을 맞이하고 그 후 겨울이 되어 남겨진 가족들의 삶을 야기한다. 화면에는 계절이 등장하지 않지만 성진의 누나가 출산을 함으로써 비로소 봄과 희망이 찾아온다. 계절의 풍경을 전체적으로 멀리서 잡아주는 카메라의 기법을 통해 자연 풍경과 어우러지는 화면은 서사적으로도 연출적으로도 영상미를 자아낸다. 더불어 가족이라는 이름의 애증 어린 시선으로 구성된 화면으로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오는 오해와 삶, 오랜 시간에 가려져 있던 소통의 불화를 그려낸다.